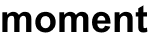건축가는 금속을 다루며 비로소 정밀함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른바 ‘습식 중독자’들이었다. 세상의 모든 가벼움을 의심했고, 콘크리트가 굳어가는 속도만큼이나 느리게, 그러나 단단히 건축을 해왔다. 무언가를 짓는다는 행위를 곧 ‘타설’과 동일시해 왔다. 철근을 엮고 거푸집을 세우고, 진동기를 울리며 새벽까지 타설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내 일을 다 하는 것 같았다. 콘크리트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오랜 시간 익숙해진 방식이었다. 안과 밖이 똑같은 콘크리트는 마치 도자기처럼 모든 것을 품어내는 예술품으로까지 여겨졌다. 하지만 2015년 12월, 스페이스X의 1단 추진 로켓이 수직으로 지구에 착륙하는 장면을 목격한 순간, 우리는 어떤 ‘종말’을 직감했다. 육중한 금속 덩어리가 지표면에 수직으로 내려앉는 그 장면은, 어쩌면 콘크리트로 대변되는 건축의 시대가 막을 내리기 시작했음을 보여준 것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 쌓고 다시 부수는 방식으로는 도시를 지속시킬 수 없음을 체감했다.
하이브 사옥 : 조립되는 도시
©KIMKYUNGTAE
이후 몇 년이 지나, 우리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약 2만 평, 즉 백 평 규모 신축건물 200채에 해당하는 이 작업은 단순한 리모델링을 넘어, 일종의 도시 단위 재건 실험이었다. 우리는 이 작은 도시를 부수고 다시 쌓는 방식이 아닌, 조립을 통해 재건하고자 했다. 이동 가능하고 해체 가능한 건축. 극단적으로 말해 사용자가 이사를 하면 건물도 함께 뜯어 갈 수 있는 구조. 그것이 우리의 이상이었다. 설령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고물상에 팔 수 있는 구조라면 그것만으로도 지속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철은 콘크리트와 달리 현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밀한 설계를 토대로 공장에서 제작되며 현장에서는 조립될 뿐이다. 단단하지만 가볍기에 운송이 자유로운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볼트와 너트로 조립되는 과정에서 오류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수정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가장 큰 이유이다. 가벼운 연장으로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조립하는 과정을 보고 있자면 이 행위가 건설이라기보다 뜨개질에 가깝다고 느껴질 정도다. 작은 소시민들의 협력으로 거대한 도시가 조립되는 것이다.
©ROHSPACE 하이브 사옥 내부
우리는 기존 건축물에 붙어 있던 다양한 마감재나 부속 구조물들을 단순한 ‘기존 요소’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잠재된 인프라이자, 조립형 건축을 위한 뼈대였다. 때론 공조를 위해 만들어진 뜬 바닥구조는 움직이는 벽체를 위한 레일로 재구성되었고, 때론 천장의 마감재를 고정하기 위한 철재 프레임이 수직 모듈 시스템을 위한 일부가 되었다. 물론, 이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 무엇보다 철골과 금속을 기반으로 한 건축 시스템은 건축가에게 설계의 극한을 요구한다. 노출 콘크리트의 경우 도면상 ‘노출콘크리트 면 처리’라고만 표기해도 현장에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철골 구조는 전혀 다르다. 수십 개에 이르는 부재를 설계자가 정확히 이해하고, 하중의 흐름을 면밀히 계산해야 한다. 확대 단면, 상세도, 시방서와 공법서까지. 단 하나의 벽체를 위해 10장의 도면이 요구되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체질 개선을 위한 ‘비용’이라고 판단했다.
우리의 실험은 단지 재료의 변화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고정된 구조 위에 기능을 부착하고, 해체와 재구성이 가능한 인프라를 도입하며, 가변적인 벽체 구조를 실현하고자 했다. 철근콘크리트로는 구현할 수 없는, 사용자의 변화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구조. 그 ‘움직이는’ 건축에 우리는 푹 빠져 있었다.
다비엔 섬을 위한 보행교 : 철교 위의 공원
베트남 후에시(Huế City)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도시지만, 전쟁의 상처와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유물이 소실되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작은 박물관을 설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이 박물관은 강 한가운데의 섬에 위치할 예정이기에, 섬으로 진입하기 위한 100미터 길이의 보행교 설계도 함께 진행 중이다. 보행교는 구조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건축보다 토목의 영역으로 인식되기 쉽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강을 건너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보행교가 아니라, 강 위에 떠 있는 하나의 ‘장소’로 해석하고 접근하고자 했다.
가볍고 투명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철골 구조의 채택은 당연한 전제로 시작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해결의 영감을 준 것은 1943년 아르헨티나 건축가 아만시오 윌리엄스(AmancioWilliams)가 설계한 철근콘크리트 주택이었다. 시냇물 위에 놓인 이 주택은, 아치형 철근 콘크리트 보 위에 전체 구조가 얹혀 있으며, 그 보가 시냇물을 가로지르며 지지를 담당하고 있기에 ‘브리지 하우스(Casa sobre el Arroyo)’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완공된 지 80년이 넘은 이 모더니즘 건축물에서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철골조가 가진 가능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FHHHFRIENDS 다비엔 섬을 위한 보행교 구상 도면
우리는 보행교자체가 되는 공원을 지탱하는 구조가 되는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폭 3미터 길이100미터의 보행교와 그와 상응하는 볼륨의 또다른 공원이 교차하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우리는 보행교 자체가 공원이 되고, 그 공원을 지탱하는 구조가 되기를 바랐다. 폭 3미터, 길이 100미터의 보행교와 이에 상응하는 또 하나의 볼륨이 교차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이 두 개의 교차하는 볼륨은 내부에서 일종의 복합성을 유도한다. 걷는 행위와 머무는 행위가 교차하며, 도심의 광장에서 일어날 법한 다양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랐다. 볼륨의 영역을 결정짓는 구조체는 곧 외피가 된다. 우리는 이 구조가 도시에 투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마감재를 붙이지 않았다. 물론, 이는 엄청난 양의 도면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이러니 우리는 맨날 시간이 없고 돈도 없다.
©FHHHFRIENDS 보행교 건식 설계
건축가의 일이 단순히 아름다움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수 mm 단위의 오차까지 고려하는 정밀 설계라는 점에서, 나는 진정한 장인은 손에 망치를 든 사람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밀한 설계의 과정 그 자체가 장인의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 도시 과밀, 자원 고갈 같은 문제들에 가장 정직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이런 치열한 ‘건식 설계’라고 믿는다.
우리는 여전히 도전 중이다. 그러나 이 글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건축가들과 도시 설계자들에게 조심스러운 화두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익숙한 무게를 의심했고, 이제는‘가벼움’의 정밀함을 경외하게 되었다.
윤한진 : 건축가. 푸하하하프렌즈의 공동대표이다. 유년기에 과학상자대회에서 입상한 이후 오랫동안 과학자를 꿈꿔왔으나 건축가가 되었다. 숫자에 약하다.